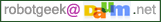전기장을 배우다 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 다른 표현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전속밀도(D , Electric Flux Density)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계강도(E , Electric Field Strength)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 수학적으로는 계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막상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 문제를 풀고 풀고 또 풀고 보면 기하학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비슷한 개념이라면 그냥 하나면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배워야 되는 것일까. 전속밀도와 전계강도의 관계는 D = εE 로 나타낸다. 이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1. 기학(氣學)
기학(氣學 )이란 공간(Field)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기(氣)라는 것은 공간(Field)여기저기에 있는 것이고 그 공간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기가 많이 모여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며 기가 적게 모인것을 나머지 공간이라고 부를 뿐이다. 물질과 나머지 공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확률적으로 분포한다고 표현한다. 말을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면 원자 주변에 전기(電氣)가 모여있는 것이다. 원자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핵 주변에 전기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인 것이다.
직접 접촉에 의해서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뉴튼 역학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접촉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기학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는 단일한 성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음양(陰陽)이 같이 존재해야 한다. 하나만 존재해서는 기(氣)도 공간도 있을 수 없다. 양전기가 있다면 어딘가에는 음전기가 존재해야 한다. 전송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전기는 전송선의 주변을 둘러싼 공간을 통해서 전달된다. 즉, 공간을 통해서 기를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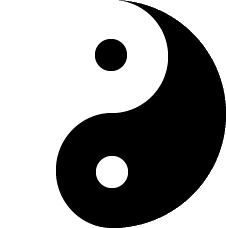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理) 와 기(氣) 에 대한 논쟁은 다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재미있다. 이(理)는 원인이고 기(氣)는 현상이라고 하던 구절이 생각난다. 전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理)는 전속밀도(D)이고 기(氣)는 전계(E)이다. 전기적 공간내에서 전하가 느끼는 것은 전계이기 때문이다. 전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하이며 이것은 이(理)에 해당한다. 한자가 대량으로 등장해서 짜증나고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어찌되었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는 논쟁은 이미 그 당시부터 있었던 셈이다. 그런면에서 전자기(氣)학이라고 이름을 붙인것은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있다. 전기학은 전기적 공간 (Electric Field)를 다루는 학문이고 이것은 전기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인 전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적 공간을 만드는 근원인 D는 유전체의 전하유혹에 의해서 변형되어 실제와는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 유전체의 유혹을 ε 라 하고 혹(惑)이라고 불러보자.
혹(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blog.naver.com/adbank/140111673037
기(氣)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을 참고:
http://blog.daum.net/gycenter/2600274
2. 흐름(Flux)
흐른다는 말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물'이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세요.] 와 같은 표현에서 [흐르는 물] , [손에 닿는 물의 느낌] 같은 것이 머리 속에 떠오른다. 보통 [흐른다] 라고 하면 유체(fluid)를 떠올린다. 기름이나 물 , 아니면 가스 같은 것이다. 냇가에서는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과 느리게 흐르는 곳이 있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발목과 정강이에서 느껴지는 물의 세기로 알 수 있었다.
이런 흐름들은 벡터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무곳이나 점을 찍고 그 점에서의 느낌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다.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하고 흘러가는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이런식으로 표시해 나가면 Vector Field 를 만들 수 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 화살표의 접선 방향으로 선을 이어나가면 Streamline 이 된다.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Streamline 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각각의 지점에서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Vector Field 가 더 이해하기 쉽다.
Google 의 Vector Field 이미지:
http://www.google.com/search?complete=1&hl=ko&q=vector+field&lr=&um=1&ie=UTF-8&tbm=isch&source=og&sa=N&tab=wi&biw=1004&bih=674
흐름을 3차원으로 표현한 모습:
http://www.siggraph.org/publications/newsletter/volume-42-number-2/interacting-with-three-dimensional-flow-fields
공기가 흐르거나 물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flux 를 쓰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만 전하 분포가 변하지 않는 정전기학에서 flux 를 쓰는 것은 정말 아리송하다. 이게 다 맥스웰 때문이다. 패러데이는 역선 (Lines of force)의 개념을 통해서 힘의 분포,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했다. 맥스웰은 이 방법을 발전시켜서 역관(Tubes of force)을 생각해 냈다. 관을 통해 흐르는 유체가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전기적 공간에서도 유체의 흐름을 연상시켜 생각하면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자칫 실제로 뭔가 흐르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뭔가가 흐른다면 전부 흘러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런 의문이 끝도 없이 꼬리를 물면서 혼란을 준다.
맥스웰은 전자기학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등에도 뛰어난 업적을 지닌 학자였기 때문에 가상의 관을 통해서 힘이 전달된다는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Electric Flux)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마치 유체가 관을 따라 움직이며 힘을 전달하듯 무엇인가 공간에 존재하는 관을 통해서 힘이 전달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를 낳는다. 관을 따라서 어떤 것이 전달된다면 원래 있던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마치 이것은 원자모형에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핵과 충돌하느냐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과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외로 문제가 쉽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주위에 에너지가 분포해 있는 것이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분포해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측정가능한 수준에서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면 된다. 하지만 측정가능한 수준이하에서도 그것은 존재한 것이다.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리 잡음(Noise)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 백색 잡음(White Noise)이 존재한다. 백색 잡음의 존재는 공간을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주파수 대역에서 존재한다. 잡음을 느낄수 없다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흐름의 양을 알려면 면적을 따지면 된다. 면적을 통과하는 양이 많으면 흐름이 많은 것이고 양이 적으면 흐름이 적은 것이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면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양을 따지면 된다. 그런식이라면 전속밀도의 기준이 왜 단위면적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Flux 를 사용하면 측정의 기준단위가 점에서 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flux 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벡터 A 는 방향을 가진 흐름이고 벡터 n 은 측정하려는 면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벡터이다. 이 둘을 내적하고 적분한 결과를 flux 로 계산한다.
면벡터(area vector)는 상당히 독특한 벡터이다. 크기가 길이인 일반적인 벡터와는 달리 크기가 면적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기준을 면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래 그림에서 크기는 S이고 n에 모자를 씌운 모양은 면에 수직한 단위벡터이다. 면에는 방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

면벡터는 측정을 하려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실제 흐르는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려는 방향으로 흐르는 양을 재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흐르는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이 다르다면 재는 양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측정을 하는 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한다.
흐름을 이용하여 힘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유압장치다. 피스톤에 기름을 채우고 압력을 가하면 기름이 힘을 전달해 준다. 전기적 힘도 마치 공간에 퍼져있는 기름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가상의 물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다. 물질을 통해서 전달하든 공간을 통해서 전달하든 기본 개념은 같다.
3. 움직이는것,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투명인간이 방안에 있다. 투명인간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뿌려보는 것이다. 물을 뿌려서 투명인간의 몸에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투명인간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투명인간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라도 해도 흐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 때 나타나는 모습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를 보는 것인가. 어느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 뿌려진 물은 투명인간의 몸을 타고 흐른다. 흐름은 무엇인가 흐르게 만드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기장의 모습을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하는데 실제로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다.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하를 뿌려보면 화살표에 표시된 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표시다.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있었을 때 그 전기장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1C 의 전하를 뿌린다. +1C의 전하가 움직인 궤적이 전기장의 모습이다.
Sony 의 Bravia 광고가 이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공 대신 전하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
화살표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표시할수도 있고 이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수도 있다. 또, 이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일수도 있다.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일수도 있다. 그런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국내에 나와있는 일부 전자기학 책 중에서는 가우스면을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개수를 따지는 무의미하다. 선이 몇개인지 셀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은 시각적인 표시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화살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

천원은 누군가에게 로또를 사도록 만든다. 누군가는 천원을 받기 위해서 움직인다. 천원은 무엇인가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천원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천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천원은 물질인가 가치인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천원을 준다고 해보자. 당신은 쓸모없는 종이조각을 주었다며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천원이 공짜로 생겼다고 좋아할 것인가. 천원을 물질 개념으로 본다면 흔한 종이조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천원을 가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천원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 된다.
현대는 가치가 정보로 표시된다. 나의 은행 계좌 잔고는 은행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비싸고 성능이 좋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인가. 계좌에 있는 돈이라는 가치는 하드디스크라는 물질로 평가될 수 없다. 정보로 표현된 가치로 평가될 뿐이다. 가치는 돈으로만 표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쓸 때 발생하는 포인트, 게임을 하면서 쌓이는 경험치 등은 내가 하는 노동의 댓가, 내가 하는 활동의 부가가치들이다. 이렇게 쌓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만든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물건을 찾아주고 택배 배송비를 지불하면 물건을 배달해준다. 내가 가진 가치가 만들어낸 움직임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여론은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1/05/03/us/20110503-osama-response.html?hp

전기적 에너지가 분포한 공간이 전기장이다. 정치적 에너지가 분포한 공간은 정치장인가? 그렇다면 저 공간에서 시험정치입자를 놓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여론은 미디어에 의해서 왜곡된 본질을 느끼는 것이므로 그림에 표시된 점들이 본질은 아니다.
유전율은 유전체라는 미디어의 고유한 성질이다. 얼마나 유혹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낚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미디어의 성질이다. 낚이는 정도(또는 우왕좌왕 하는 정도,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정도)에 내가 느끼는 존재감을 곱하면 실제의 존재가 된다.
이런 상상을 자꾸 해보는 것은 공간, 에너지, 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정전계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분포한 모습을 보고 시험전하가 어디로 어떻게 힘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4. 전기장을 재는 틀
전기장에서 전기를 느끼려면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1m 이고, 금속판의 면적은 1m2 이다. 전기장은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도 일정하다.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 아무데서나 아래와 같은 측정을 하면 전기장을 만들어낸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 전속밀도의 단위는 C/m2 이다. 많은 사람들이 D = εE 를 오해한다. " E에 계수를 곱하면 D가 되는 것이 아닌가?" E 의 단위는 V/m 이고 D 의 단위는 C/m2 이므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유전율 ε 의 단위는 F/m 이다. 상대유전율은 차원이 없는(Dimensionless) 상수라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상대유전율에 자유공간의 유전율을 곱한것이 유전율 ε이다.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회로를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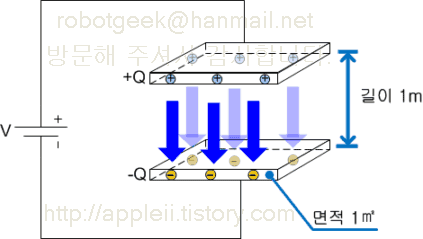
측정을 위해서 가상의 틀을 만들고 재어 보면 된다. 그 틀은 거리 1m 간격을 두고 떨어진 1m2 의 금속판에 있는 전하의 양이다. 전계강도(E) 는 시험전하 +1C 이 느끼는 힘이라는 정의를 충실하게 반영한 N/C 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1m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나 나느냐를 따진 V/m 를 더 많이 쓴다. 전압이라는 단위가 전기회로에서 익숙하게 쓰이고 있고 자계강도의 단위인 A/m 와 결합하면 전자기파의 전력을 나타내는 W/m2 를 나타내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이 N/C 보다 V/m 를 더 많이 쓰는 이유인것 같다.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전계는 실제로는 위와 같다. 옆으로 새는 전기력선을 무시하면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전기력선만 남는다. 그 사이에서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일정하므로 전계도 일정하다. 전기력선 밀도가 일정하니까 전계가 일정하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갈수도 있다. 화살표를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상상해보자. 빗방울 사이를 움직였을 때 빗방울이 더 많이 떨어지는 곳 (빗방울의 밀도가 높은곳)은 더 많이 우산에 맞게 된다. 우산에 빗방울이 많이 떨어질수록 강도가 센 것이 된다. 빗방울의 밀도가 같다면 어디에서 맞더라도 같은 강도가 된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같은 곳은 어느 지점이라도 전계강도가 같다.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는 유전체가 위치해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공간 자체가 유전체이다. 유전율의 단위인 F/m 는 길이가 1m 인 유전체가 양 끝에 위치한 금속판에 얼마나 많은 전하를 유도할 수 있는가 (또는 유혹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낸다. F/m 에서 F 는 전기용량의 단위인 Farad 이다. 따라서 D= εE 는 존재(D)와 존재감(E)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ε)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를 1V 주었을 때 금속판에 모이는 전하량 (C) 이다. F = C/V 이다. F*V = (C/V)*V = C 이다. 유전율과 전계강도의 단위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전속밀도의 단위가 된다.
따라서 전속밀도는 전계강도에 상수를 곱한 것이 아니다.
D와 E 의 관계는 위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 \chi_e\) 와 \(\epsilon_r \)은 상수이지만 \( \epsilon_0\) 는 상수가 아니다. \( \epsilon_0\)의 단위는 F/m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위의 변환을 위해서이다. F = ma 이므로 1N (newton)은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1m/s2 으로 움직이기 위한 힘이다.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힘을 받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다. 이 둘간의 변환이 필요하다. 전기회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위는 V(Volt), F(Farad), A(Ampere) , C(Coulomb) 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재미있는 것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 때문에 힘을 받지만 움직일 때는 질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힘을 받는 것은 전기적 공간이고 이동은 중력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커패시터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유전체는 다른 말로 절연체(絶緣體)라고도 한다. 연(緣)을 끊는(絶)다는 말이다. 유부녀는 총각을 혹(惑)하되 연(緣)하지 않는다. 연(緣)하면 열(熱)하고 파(破)한다. 그것을 절연파괴라고 한다. 전기가 통한다는 뜻의 통전(通電)과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의 통정(通情)의 공통점은 하고나면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다.

어떤 가치는 다른 형태의 가치로 변환이 가능하다. 100원 짜리 연필을 도매상가에서 구매한후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다고 생각해 보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가 100원인 연필이 1000원이 되었으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매상가로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 이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교통비, 구매하는데 소모하는 노동력을 생각하면 결코 폭리가 아니다. 1000원 연필을 100원에 구매하기 위해서 도매상가로 직접 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100원 연필이 1000원에 팔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가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자. 상대방에게 그것이 귀찮고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이다. 심부름의 댓가로 만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고민을 할 수 있다. 심부름을 하기 위해 소모해야 되는 시간, 노동력의 가치가 만원이라는 금전가치로 환산이 가능한가? 이 환산과정을 통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심부름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심부름은 만원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그 심부름을 만원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만원은 그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하는 전기적 공간을 만들고 다른 전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하는 양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전하량(C)이라고 한다. 전기적 공간의 어느 한점에서 시험전하가 느끼는 힘(또는 시험전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은 단위면적에 모인 전하량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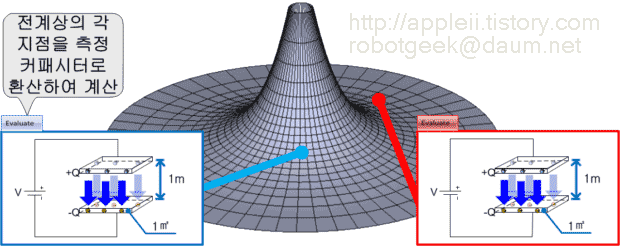
즉, 전계의 매 지점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를 가상으로 만들어낸 측정용 커패시터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편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점을 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측정용 커패시터는 두 금속판 사이의 전계가 어느 지점에서도 일정하므로 사실상 점의 관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유전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appleii.tistory.com/52
전기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appleii.tistory.com/74
5. 존재와 존재감

누군가의 존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직접 만나서 느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느낀다. TV, 신문 , 인터넷 ,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미디어를 통해서는 존재의 일부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사진으로 보았을때와 트위터로 보았을 때의 느낌은 다르다. 미디어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찰자가 그 의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그 영향을 Susceptibility ( \(\chi_e \))라고 한다. (또는 냄비근성이라고도 한다.) 특히나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
누군가의 존재를 알게 될때 사실 그의 단편만을 보는 것이다. 그 단편들을 모두 모아야 존재 전체를 알 수 있다. 또한 그 단편들은 매체(Media)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를 느끼게 될 때는 약간의 왜곡이 발생한다. 어떤 존재의 단편, 그리고 그 단편을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 이것들간의 관계가 D=εE 이다. D 는 존재의 단편, ε 는 매체의 영향정도, E는 '단일한 나'가 느끼는 감정이다. ε에는 매체에 의해서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정도인 \( \chi_e \) 가 있다. 같은 단편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정이 흔들리기가 쉽다. 이것을 '떡밥'이라고 부른다. 이제부터 떡밥을 \(\chi_e \) 라고 부른다. 떡밥이 클수록 존재의 단편이 가지는 원래 모습을 느끼기 힘들다.
존재가 단편화되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모으면 존재가 된다. 그리고 공간 여기저기에서 그 단편들을 평가(evaluation)한다. 존재의 단편과 매체, 그리고 내가 느끼는 존재감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수 있다. 각각의 점들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점에서 면으로 바꾸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존재(identity)는 명확한 선이나 면이 아니라 뿌연 안개같은 것이다. 인위적인 선이나 면을 설정하여 평가(evaluation)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선이나 면이 존재를 제한할 수는 없다. 가우스 표면을 어떤 모양으로 설정해도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대칭인 모양으로 해도 되고 특별하게 지칭할 수 없는 모양이어도 상관없다. 그저 평가를 위해 도입한 것일 뿐이다. 공간에 시간을 더한 시공간에서도 존재감을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수단은 안테나이다. 하나의 송신 안테나에서 전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면 전자기적 공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수신 안테나에서는 이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느끼기 위해서 믹서로 주파수를 변환시키고 트랜지스터로 크기를 키울 뿐이다.
존재와 존재감에 대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5 - 제국의 역습] 에서 마스터요다가 포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정말 보석과도 같은 대사이다. 에너지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묘사한 글이 또 있을까? 스타워즈는 이래서 시대를 초월한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은 [물질의 총합]이 아니라 [사실의 총합]이라고 말했다는데 정말 그럴듯하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느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존재라는 것은 느낌을 모두 모은것이된다.
스타워즈의 포스를 소재로 사용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보자. 아이들은 포스에 열광한다.
SPECIAL EDITION HD - Volkswagen Commercial: The Force from Dave Mathews on Vimeo.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서는 모든사람들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빛이 나와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 있다. 빛은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에너지 응축체가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수도 있다. 실제로도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것이 장(Field)이다. 스타워즈에서도 그랬지만 에반게리온에서도 빛이 본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것 같다.

주파수를 달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왼쪽 사진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열상(Thermal Image)을 볼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도 보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열상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세상이 원래 그런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열상만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 존재감은 미디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미디어가 없다면 존재도 없는 것이다.
각자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다르다. 만약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온통 흰색으로 빛날 것이다. 결국 어떤 것도 구별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구별되지 않는 것을 백색잡음(White Noise)라고 한다. 백색 잡음은 없앨 수가 없다. 결국 물질과 공간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전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존재는 D이다. 그리고 전기적 공간에서 전기는 E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전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은 또다르게 보인다.
6. 들판과 마당
물리학자와 소설가가 책을 소개하는 쇼에 나와서 서로 한마디씩 논평을 한적이 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물리학자는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소설가는 단 한문장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그속에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결론이 나 버렸다. 차라리 소설가가 양자역학 책을 썼으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소설]을 써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소설]을 쓰면 문외한이 아는척 한다고 그랬을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학자라면 무조건 수학계산을 잘해야 되는것이고 철학자는 수학에 대해서 말하면 안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복잡한 수학계산은 어렵지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정도의 개념은 보통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이야기하면 "수학도 못하는 주제에..." 라며 깔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 대상의 책들은 무조건 수식을 없애야 된다면서 글자만 가득하게 복잡하게 쓴 책들이 많다. 간단한 그래프 하나, 간단한 수식을 쓰면 아주 쉬워지는 내용인데도 말이다.
그러다 보니 수식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수식을 아예 없애고 글자를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것도 무조건 한글로 쓰면 쉬워진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Field 를 [들판] 이나 [마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한국사람에게 들판이나 마당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면 전자기학에서 사용하는 Field 의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場)이 마당이라는 뜻이니까 마당이라고 쓰고, Field 는 들판이라는 뜻이니까 들판이라고 쓰자는 이야기일까? 영어권에서 Field 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들판과 마당이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를 키울수 있는 번역이 나온다.
그런데 Field 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Field 를 영역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을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각각이 Field 가 된다. 이것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고유한 영역이다. 하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으면 Record 가 된다. 오히려 이것이 전자기학에서 말하는 Field 의 뜻에 가깝다.

말하자면 하나의 물질(또는 공간상의 점)은 전기적성질, 중력적 성질 등의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Record 이며 그 중에서 전기적 성질은 전기적 Field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학에서의 Field 는 공간에서의 전기적 성질이다.
그런식으로 Record 를 모으면 세상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알고 보면 세상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가득찬 것이 아니라 정보가 가득찬 것일지도 모른다.
7.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왜 높을까? 산 밑에 용이 살기 때문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산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산 밑에 용이 살기 때문에 높아졌건 아니건 산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전자기학에서 장을 표현할 때 전하를 표시한 후 그 주위의 원을 그린다. 그리고 그 주위로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것이 장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식으로는 장을 이해할 수 없다. 전하와 원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 화살표는 실제로 무엇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지 알수 없다.원자모형을 배울때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그린다. 그러다가 핵 주위에 전자구름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 핵 주위를 전자가 회전하는 그림은 전자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핵 주위의 전자구름이 있는 모습은 전자가 여기생겼다가 저기 생기는 것을 반복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산 밑에 무엇이 있건간에 산은 그 자체로 산일 뿐이다. 어디서부터를 산이라고 불러야 하는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산은 산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린왕자]에서 중절모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 나온다.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것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사실 세상의 모습은 크기의 차이일 뿐일수도 있다.
http://www.newgrounds.com/portal/view/525347
입자가속기에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것 보다는 더 낮은 단위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야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이하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었으니 입자인지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던 것이다. 입자를 쪼개면 새로운 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론은 꼭 전하가 있어야 전기적 공간이 생긴다고 말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냥 전기적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전기적 효과를 전하로 환산할 수 있을 뿐이다. 마치 산이 있다고 해서 산 밑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술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자기학] 벡터의 표기방법에 대해 (2) | 2011.08.07 |
|---|---|
| [전자기학] 변위 (Displacement) 에 대해서 (25) | 2011.05.26 |
| [asm] and 연산으로 홀수 짝수 구별하기 (4) | 2009.09.19 |
| [오픈캡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브러쉬 색으로 그리기 (1) | 2009.09.06 |
| [오픈캡쳐] 개선된 선택영역 지정방법 (0) | 2009.07.16 |